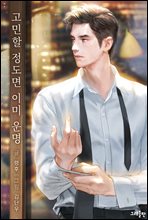상세정보

란을 위하여
- 저자
- 령후 저
- 출판사
- 그래출판
- 출판일
- 2017-01-13
- 등록일
- 2018-07-0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류란, 오랜만이다?”
팔 년 만에 만나 이렇게 쉽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니 그렇게 어려운 상대도 아니었는데 괜히 경계를 하고 있었다.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
그를 보고 있으면 검은색 재규어가 생각났다.
그가 먼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커다란 손이었다. 마디가 툭 튀어나온 긴 손가락이 한눈에 들어왔다.
팔 년 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는 이렇게 손을 내밀었었다. 그때 그녀는 어떻게 했더라?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열여덟 살의 만만한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란은 그의 손을 살짝 잡고 힘을 주기 전에 빼내었다. 갑작스럽게 뺐다는 걸 느꼈던지 그는 자신의 손을 한번 쳐다보고서야 거두었다.
“한눈에 알아봤어. 그 큰 눈도 그대로네. 처음엔 겁먹은 사슴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는 답답한 듯 단정하게 매져 있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기고 목의 단추를 풀었다. 산들산들한 바람이 스쳐지나왔다.
시작되는 봄의 냄새는 늘 사람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든다. 공기가 맑고 깨끗할수록 그 향은 더욱 짙다.
“내 이름은 기억해?”
그녀는 꽤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다. 학창시절엔 공부도 꽤 잘했었으니까.
이상했다. 그의 아버지인 호영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수련의 이름은 기억이 났지만 그의 이름은 이상하게도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태인이야. 박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