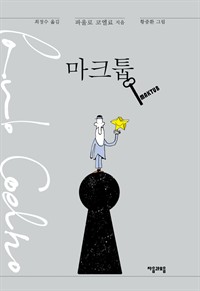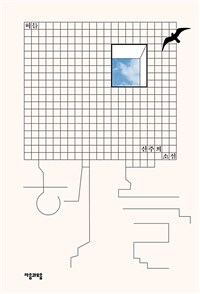
허들
- 저자
- 신주희 지음
- 출판사
- 자음과모음
- 출판일
- 2022-12-18
- 등록일
- 2023-02-0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7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제21회 이효석문학상 우수상 수상작 수록
서로의 존재를 위한 이야기, 신주희 두 번째 소설집
『모서리의 탄생』 이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지속해온 신주희의 두 번째 소설집 『허들』이 출간되었다. 이번 소설집에는 제21회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마저 스스로 선택하는 예술가들의 고군분투를 형상화”하며 “보들레르식의 야생성까지 느껴”진다는 평을 들은 「햄의 기원」을 비롯해 일곱 편의 이야기를 실었다. 신주희는 일상의 벽 속에서 분투하는 다양한 층위의 인물들을 서사 속으로 불러와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요구하는 외부 세계와 이에 저항하는 내부 세계의 충돌을 다룬다.
서로의 존재를 마주하기 위해 넘어서야 하는 시선의 허들
납작한 세계를 다시 한번 부풀리는 일곱 편의 이야기
소설의 표제작인 「허들」은 주인공인 ‘나’가 쓰는 유서의 형식을 띤다. 이 유서는 오직 그녀의 어머니에게만 발송되는 것인데, 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에게 평범한 삶을 요구하는 일반적이고 범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성이 지니는 압력은 주인공에게 “삶에서 넘어서야 하는 지나치게 높은 허들”인 동시에 “‘나’의 삶을 그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압력을 견디는 삶으로 만들었다.” 「허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작품인 「로즈쿼츠」는 죽은 엄마의 삶을 반추해가며 “피해자 되기의 삶에 집중했던” 주인공의 목소리를 듣는다. 자신의 삶을 망가트린 어머니에 대한 피해 의식은 이야기의 걸음에 따라 “온전히 그녀의 말로 설명된 적 없는 과거의 기억들을 반추”하는 방식으로 증폭되며, “그저 가해자일 수 없는 삶의 입체성을 다시 파헤치고 부풀린다.”
나아가, 소설의 주인공들이 겪는 압력에는 누군가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포함된다. 타인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유해한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휘발, 공원」에서, 연인들은 SNS 셀럽의 가십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사랑을 굳건하게 만들려는 행위가 가진 기만성을 폭로하고, 「저마다의 신」 에서는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단절과 상실로 얼룩진 시대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저마다의 신을 요구하는 외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는다.
「소년과 소녀가 같은 방식으로」는 탈북민의 이야기를 다룬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어렵사리 들어왔지만 생활은 안정적이지 않다. “영도는 그 일을 통해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영도는 제약회사의 약물 실험에 참여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그는 자꾸만 자신과 함께 탈북 행렬에 함께했지만 결국 죽은 기은을 떠올리면서, 이 구조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피해자-가해자의 이분법으로 가를 수 없는 타자와의 연루와 그것을 통해서 입체화되는 자기 삶에 대한 이해에 의해서 환기된다.”
걸려 넘어지더라도 뛰어야만 하는 존재들의 연루 방식
“나는 나의 유서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일곱 편의 단편들에서 각기 다른 인물들은 결국 “삶은 돈이 들어. 생존은 그보단 좀 덜 들고. 존재하는 것? 실은 그게 가장 비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 사이에는 생존과 사람다운 삶, 그리고 평범하게 존재하는 것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 그들이 원하는 삶에 가닿을 방법은 망연해서 그들은 그저 삶을 견디는 존재가 된다.
인물들은 자주 질문하고, 절망하고, 의문을 가지지만 신주희는 이에 직접 답해주거나 깊은 내적 진실을 설명하는 대신 이들의 곁에 가만히 있어주기를 택한다. 이 “있어주기”의 모습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요청하는 또 다른 지지이기도 하다. “존재의 대가는 타자와의 우연한 연루, 불확실하고 취약하기에 그만큼 복잡하고 입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값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박인성 평론가의 말처럼, 우리는 “자기 존재에 대한 희망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신주희는 불친절한 타자들이 서로 걸려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서로가 연루되는 바로 그 순간들을 포착한다. 포착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던 납작한 세계는 부풀어 오르며, 자기 존재에 대한 희망이 함께 피어오르게 된다. 견디는 삶에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장소에의 열망은 바로 이곳에서 발원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희망 속에서 서로를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평범함을 요구하지만, 평범하게 살기 위한 조건조차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직된 모습은 외부 공기의 기압을 버티기 위해서 한껏 부풀어 있는 허파를 떠올리게 한다. 허들이란 그저 평범함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위해 넘어서야 하는 진정한 타자의 눈높이를 제시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이 허들은 설령 우리가 그 기준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뛰어야만 하는, 깊이 있는 존재의 연루 방식이다.
―「해설」중에서, 박인성(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