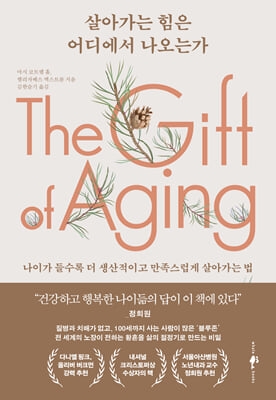왠지 클래식한 사람
- 저자
- 김드리 저
- 출판사
- 웨일북
- 출판일
- 2018-11-09
- 등록일
- 2019-09-0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7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책 속으로
거슈윈은 어쩌다 그렇게 흥부자, 리듬부자가 되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는 어렸을 때 음악보다 스포츠에 재능을 나타냈다. 그는 음악은 여자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야구, 테니스, 수영, 승마 등 못 하는 운동이 없었다. (중략) 거슈윈은 어느 날 친구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감명을 받아 음악을 시작했다. 그때 들었던 곡이 <유모레스크Humoresques>다. 이 역시 매우 재밌는 리듬이 특징인 곡이다. 이 곡을 이루는 ‘부점리듬’은 앞이 길고 뒤가 짧아서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듯하다 하여 ‘깡충리듬’이라고도 불린다. 그 생기 있는 리듬이 어린 거슈윈에게 잠재되어 있던 음악적 끼를 깨워준 듯하다. 그때 친구가 <유모레스크>가 아닌, 느리고 서정적인 곡을 연주했다면 우리가 오늘의 거슈윈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니, 참 다행이다.
p.60~61
당시 파가니니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바이올린 실력을 얻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특히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의 G현 하나만 사용해서 연주하는 곡을 만들었는데, 한 줄로 연주하는 것이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워서 악마에 관한 루머는 꼬리를 물고 커졌다. 그 G현이 그가 목 졸라 살해한 애인의 창자를 꼬아 만든 줄이며,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아 연주한다는 소문이었다. 이 괴소문은 언론과 종교계에까지 파다해, 교회를 중심으로 그가 정말 악마라며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세력이 생겨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크고 마른 체구와 매부리코, 헝클어진 머리카락도 ‘파가니니 악마설’ 생성에 힘을 보탰다고 하니, 악성댓글로 상처받는 오늘날 연예인들의 심정을 그는 좀 알아주려나.
p.87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곡,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은 고르기가 참 어려운데, 오페라 중에서는 나에게 가장 강력한 작품이 있다. <카르멘(Carmen)>이다. 프랑스의 작곡가 비제(Georges Bizet, 1838~1875)의 작품으로 스페인의 뜨거운 정열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정말 ‘매력’ 하나로 승부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관능적이고 섹시하다. 무엇보다도 카르멘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그동안 익숙했던 여성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사랑에 열정적인 여자 주인공이 있었던가? 어릴 때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가냘프고 공주 같은 여주인공을 봐왔기에, 자유분방하고 당당한 카르멘을 보면서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 ‘쎈 언니’ 카르멘은 소프라노보다 낮은 음역의 메조소프라노가 부르도록 되어 있다. 나는 이것도 신의 한 수, 아니, 비제의 한 수라고 생각한다. ‘쎈 언니’에게는, 종달새처럼 예쁜 고음이 아니라 한층 묵직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제격이다.
p.90~91
모차르트는 유난히 익살스럽고 활기찬 장조의 곡을 많이 썼다. 앞서 소개한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아리아처럼 그의 오페라에 나오는 아리아들은 요즘 뮤지컬에 나오는 코믹송들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다. 그의 기악음악에도 번뜩이는 재치가 가득하다. 피아노를 조금 배웠던 사람이라면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티네와 소나타 중에 몇 곡은 쳐봤을 것이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는 총 19곡인데 이 중에 단조로 된 곡은 단 두 곡, 8번과 14번뿐이다. 매일 밝은 에너지가 가득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차이콥스키나 슈만 같은 사람보다 더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8번과 14번은 그 우울함이 유난히 지독하다. 당신에게 우울한 음악이 필요할 순간이 있다면, 모차르트의 단조 소나타 중 특히 8번을 꼭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모차르트가 쓴 것 맞아?’라고 느낄 수도 있다.
p.199
딸의 죽음 이후 말러가 지휘자로 있던 오페라단의 단원들은 그가 수심에 잠겨 먼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고 한다. 말러는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작곡을 한다. 말로 할 수 있다면 왜 구태여 작곡을 하겠는가?’라는 말을 남겼다. 말러의 음악이 그렇다. 말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전달이 아니라, 더욱 깊은 우물에서 힘들게 끌어올린 감정의 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으로는 풀릴 수 없는 크나큰 감정의 소용돌이가 느껴질 때 말러를 찾게 되는 것 아닐까.
p.231~232
슈베르트의 <도플갱어> 속 청년은 떠난 연인을 잊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공포와 함께 너무나 큰 절망을 느꼈던 것 같다. 어둠 속에서 조금씩 그를 향해 다가가다가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절규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어딘가 슈베르트의 자기연민도 느껴지는 음악이다. 왜 하필 저렇게 처연한 모습이 나란 말인가 하는 서늘함이 전해진다. 도플갱어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현실에서의 내 모습을 나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 자신이 제일 무서울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을지도 모른다.
p.316~317
무기력에 빠진 라흐마니노프에게 어느 날 그의 숙모가 니콜라이 달(Nikolai Dahl) 박사를 소개해주었다. 그는 최면요법과 심리치료를 하는 정신의학자였고,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비올리스트이기도 했다. 지금도 우울증이 마음의 병이므로 전문가에게 치료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 당시 라흐마니노프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찾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달 박사와의 만남은 그야말로 신께 감사할 만한 만남이 되었다. 달 박사는 몇 개월 동안 치료실 의자에서 반쯤 잠든 라흐마니노프에게 다정하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은 새로운 협주곡을 작곡할 것입니다. 분명 최고의 협주곡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 것입니다.’
P.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