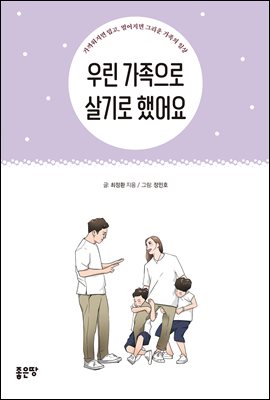상세정보

허무의 서른
- 저자
- 홍순호 저
- 출판사
- 좋은땅
- 출판일
- 2020-12-04
- 등록일
- 2021-04-1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2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어느 비 오는 날 밤 나는 너를 소환했다.
그러고는 당신의 삶 너의 여정을 나의 이야기로 소설화 했다.
바람이 불었다. 비가 내렸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나는 밖으로 나가 추모비가 있는 등대 쪽으로 바라보곤 했다. 매미 태풍에 그들이 죽고 없는 줄 알면서도 살아 돌아오리라는 어리석은 희망을 갖고 말이다. 20여 년 전 그들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이었다. 중년의 여인이 하얀 덧니를 드러내며 태풍에 침수된 상가가 바라다 보이는 경남대학교 정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인혜였다. 나는 헛것을 보고 있었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지쳐 있었고 무기력해져 있었다. 쉬고 싶었다. 그날을 떠올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긴 여정을 왔다는 생각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맑았다. 하늘에 비친 내 모습은 늙어 있었다.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고독한 긴 겨울이었다. 겨울은 춥기만 했다. 돌아온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편함에는 독거노인을 알리는 고지서가 꽂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 구름이 뭉쳐 서쪽 등대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런 구름 낀 날이나 마음이 힘든 날이면 나는 S의 추모비가 있는 바닷가 등대를 바라보곤 한다. 그러다가 고양의 하늘로 고개를 돌린다. 나의 연인 그녀를 떠올리면서…….